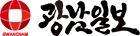[기고] 제도 밖에 방치된 산업의 민낯
김정욱 (사)한국스포츠피트니스협회 이사장
입력 : 2026. 02. 18(수) 17:52
본문 음성 듣기
가가
김정욱 (사)한국스포츠피트니스협회 이사장
피트니스 산업은 이미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있다. 트레이너, 필라테스·바레(Barre)·요가 강사는 이제 낯선 직업이 아니다. 아이들의 체형 관리부터 중·장년층의 건강 유지, 재활과 생활 운동까지 이들이 담당하는 역할은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이처럼 영향력이 커진 산업과 달리, 제도는 여전히 현실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
현재 피트니스 지도자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돼 있다. 트레이너에게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현장에서 일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필라테스, 바레, 요가 역시 마찬가지다.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는 구조 속에서 피트니스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고, 그 팽창은 곧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본격화된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설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무분별한 창업을 낳는다. 헬스장은 빠르게 늘어나고, 가격 경쟁은 파괴적으로 흐르며, 시장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 장기 이용권 선판매, 과도한 영업, 무리한 확장이 반복되고, 그 끝에는 소비자 피해와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일부 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부재한 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재 헬스장만이 구청 체육관광과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헬스장 개설 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실제 운영자와 무관하게 ‘돌려쓰는’ 관행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관리 주체인 행정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민간 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반면 필라테스, 요가, 바레 시설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즉, 개설 기준도, 지도자 자격 요건도, 관리 체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피트니스 영역임에도 어떤 시설은 관리 대상이고, 어떤 시설은 완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방치돼 온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국가자격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장의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자격증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이 민간 자격증의 비용과 신뢰도에 극심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자격 과정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저렴한 과정도 존재한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렴한 자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의 차이가 강사의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 실력과 경험이 있어도 자격의 ‘가격’ 때문에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자격 체계는 결국 현장에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뿐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례가 있다. 미용사는 국가자격이 없으면 애초에 현장에 설 수 없다. 그 결과 직업의 기준이 명확하고, 책임과 신뢰가 제도로 뒷받침된다. 인체를 직접 다루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피트니스가 오히려 더 느슨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제는 피트니스 지도자를 ‘열려 있는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관리, 사회적 신뢰를 보장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사단법인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의 관리와 검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흩어진 자격과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피트니스 산업 전반에 기준과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피트니스는 이미 전문 영역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현재 피트니스 지도자는 사실상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로 분류돼 있다. 트레이너에게는 국가자격증이 존재하지만, 이 자격증이 있든 없든 현장에서 일하는 데 법적 제약은 없다. 필라테스, 바레, 요가 역시 마찬가지다. 명확한 진입 기준이 없는 구조 속에서 피트니스 산업은 급속도로 팽창했고, 그 팽창은 곧 과잉 경쟁으로 이어졌다.
문제는 여기서 본격화된다.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누구나 시설을 열 수 있는 구조는 무분별한 창업을 낳는다. 헬스장은 빠르게 늘어나고, 가격 경쟁은 파괴적으로 흐르며, 시장은 치킨게임 양상으로 치닫는다. 수익 구조가 무너지면 장기 이용권 선판매, 과도한 영업, 무리한 확장이 반복되고, 그 끝에는 소비자 피해와 이른바 ‘먹튀’ 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일부 업주의 일탈이 아니라, 제도가 부재한 시장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결과다.
더 심각한 문제는 관리 체계의 불균형이다.
현재 헬스장만이 구청 체육관광과의 관리·감독 대상이다. 법적으로는 헬스장 개설 시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 2급이 필요하지만, 현장에서는 자격증을 실제 운영자와 무관하게 ‘돌려쓰는’ 관행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 관리 주체인 행정 역시 한정된 인력으로 수많은 민간 시설을 상시 점검하는 데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반면 필라테스, 요가, 바레 시설은 애초에 허가 대상이 아닌 자유업으로 분류돼 있다. 즉, 개설 기준도, 지도자 자격 요건도, 관리 체계도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같은 피트니스 영역임에도 어떤 시설은 관리 대상이고, 어떤 시설은 완전히 제도 밖에 놓여 있는 기형적인 구조가 방치돼 온 것이다.
여기에 또 하나의 구조적 문제가 있다. 제대로 된 국가자격 체계가 부재하다 보니, 현장의 강사들은 어쩔 수 없이 민간 자격증에 의존하게 된다. 문제는 이 민간 자격증의 비용과 신뢰도에 극심한 편차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고가 자격 과정이 있는가 하면, 비교적 저렴한 과정도 존재한다. 결국 돈이 있는 사람은 ‘인정받는 자격’을 갖추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렴한 자격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성의 차이가 아니라, 자본의 차이가 강사의 위상을 결정하게 된다. 실력과 경험이 있어도 자격의 ‘가격’ 때문에 평가받지 못하는 현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산업 구조라고 할 수 있을까. 국가가 책임지지 않는 자격 체계는 결국 현장에 또 다른 빈익빈 부익부를 만들어낼 뿐이다.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사례가 있다. 미용사는 국가자격이 없으면 애초에 현장에 설 수 없다. 그 결과 직업의 기준이 명확하고, 책임과 신뢰가 제도로 뒷받침된다. 인체를 직접 다루고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피트니스가 오히려 더 느슨한 구조에 놓여 있다는 점은 분명한 모순이다.
이제는 피트니스 지도자를 ‘열려 있는 직업’이 아니라 ‘책임이 따르는 전문직’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다. 자격이 없는 사람은 현장에 설 수 없도록 하고, 자격을 갖춘 사람은 그에 상응하는 교육과 관리, 사회적 신뢰를 보장받는 구조가 필요하다. 이는 종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자,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사단법인이 이 역할을 맡아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행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현장의 관리와 검증을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흩어진 자격과 교육 체계를 정비하며, 피트니스 산업 전반에 기준과 공공성을 부여하는 것. 무분별한 경쟁이 아닌 지속 가능한 시장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금 이 산업에 가장 시급한 과제다.
피트니스는 이미 전문 영역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직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공백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지, 이제는 사회가 답해야 할 시간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