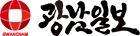[데스크칼럼] 통 큰 합의로 의료개혁 대전환을
김인수 교육체육부장
입력 : 2024. 03. 03(일) 17:44
본문 음성 듣기
가가
정부와 의료계의 힘겨루기가 점입가경이다. 정부의 강경한 태도는 그간 보지 못했던 돌파 의지가 읽히고, 의료계도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양 극단의 대치 국면에 환자들은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다.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더욱 답답하다.
정부가 추가로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장들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최후통첩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끝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의사들을 성토한다.
여론도 의사들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이 옳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한편으로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빨라 의료 대란이 혹여 장기화 되지 않을지 불안하다.
의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나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 의대’를 들어가려면 1등급 언저리로는 불가능하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늘구멍을 뚫고 의대에 진학하면 의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 의사국가고시(일반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의 무보수로 밤낮없이 콜 대기하고 당직을 밥 먹듯이 하는 고난의 시간이다.
인턴 과정을 마치면 레지던트(전공의)로 4년을 일한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전문의사가 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보통 의사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군대(군의관 3년 4개월)에 간다.
이렇게 힘들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꽃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1~2년의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16~17년, 전문의로 개업하려면 최소 36세,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라도 했으면 40세 정도에 본격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이다.
의사들의 논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 따른 사회적 화두에 대해 한층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입니다. 다른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저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최후통첩한 날에 즈음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게시한 글이 강한 울림을 준다.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의사의 파업은 최후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천의 중형 병원인 ‘뉴대성병원’은 지난 23일부터 24시간 긴급 근무에 돌입했다. 이 병원 의사들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환자들의 혼란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극히 일부이지만 용기를 낸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방식의 저항은 의사로서 기본 윤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투쟁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하길 바란다. 여론을 등지기보다는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론과 함께해야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의사 부족’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잊지 말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걱정스러운 ‘3월 의료대란’ 대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 큰 합의로 ‘의료 개혁 대전환’의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
정부가 추가로 대화의 장을 열고 병원장들까지 설득에 나섰지만 역부족이다. 최후통첩에도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끝내 환자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환자와 가족들은 ‘조직폭력배보다 더한 집단’이라고 의사들을 성토한다.
여론도 의사들 편이 아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의대 증원이 옳다고 인식한다. 그리고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밥그릇 싸움에 불과하다고 깎아내린다. 한편으로는 방향성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속도가 빨라 의료 대란이 혹여 장기화 되지 않을지 불안하다.
의사들 입장을 들어보면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다.
대한민국에서 의사가 되려면 많은 시간과 정신적, 경제적 비용을 감내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선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서울대나 연세대 등 이른바 ‘명문 의대’를 들어가려면 1등급 언저리로는 불가능하다. 거의 만점에 가까운 1등급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바늘구멍을 뚫고 의대에 진학하면 의예과 2년, 본과 4년을 거쳐 의사국가고시(일반의) 자격시험을 치러야 한다.
의사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다.
1년의 인턴 과정을 거쳐야 한다. 거의 무보수로 밤낮없이 콜 대기하고 당직을 밥 먹듯이 하는 고난의 시간이다.
인턴 과정을 마치면 레지던트(전공의)로 4년을 일한다. 레지던트를 마치고 전문의 자격시험을 치러 합격하면 비로소 대한민국의 전문의사가 되는 것이다.
남자의 경우 보통 의사나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군대(군의관 3년 4개월)에 간다.
이렇게 힘들게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고 해서 곧바로 꽃길이 열리는 건 아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뒤 1~2년의 전임의(펠로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16~17년, 전문의로 개업하려면 최소 36세, 의대에 들어가기 위해 재수, 삼수라도 했으면 40세 정도에 본격적인 수입이 생긴다는 얘기다.
이렇게 많은 시간과 노력으로 자격을 취득한 의사들에게 ‘의대 정원 확대’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일 것이다.
의사들의 논리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것은 옳지 않다. 의사가 숭고한 직업으로 인정받으려면 사회적 책무를 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눈높이에서 바라보고 판단해야 한다. 우리 사회는 필수의료, 지역의료, 공공의료 붕괴에 따른 사회적 화두에 대해 한층 높은 사회적 책무를 요구하고 있다.
“저는 대학병원의 흉부외과 전공의입니다. 다른 전공의들이 단체로 병원을 떠나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도, 저는 불안해하는 환자들을 다독이는 긴 라운딩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복귀를 최후통첩한 날에 즈음해,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은 한 대학병원 전공의가 게시한 글이 강한 울림을 준다. 정부 방침에 동의하지 않지만 현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에도 동의하지 않는다는 소신 있는 발언이다. 그러면서 “의사의 파업은 최후 수단이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 부천의 중형 병원인 ‘뉴대성병원’은 지난 23일부터 24시간 긴급 근무에 돌입했다. 이 병원 의사들 역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지 않지만, 전공의 파업으로 시작된 환자들의 혼란에 위기감을 느꼈다고 한다.
이처럼 극히 일부이지만 용기를 낸 의사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환자를 두고 병원을 떠나는 방식의 저항은 의사로서 기본 윤리를 망각한 행동이다. 투쟁을 하더라도 병원에서 하길 바란다. 여론을 등지기보다는 더 나은 정책적 대안을 갖고 정부와 대화에 나서주길 바란다. 여론과 함께해야 정부와 국민은 의사들의 주장에 귀 기울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 사회에 ‘의사 부족’에 관한 공감대는 형성돼 있다. 정부는 이 점을 잊지 말고 의료공백 사태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걱정스러운 ‘3월 의료대란’ 대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통 큰 합의로 ‘의료 개혁 대전환’의 결실을 맺어주길 바란다.
김인수 기자 joinus@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