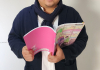기능·예능 두루 겸비 "돌고 돌아 악기장 됐죠"
[남도명인] 이복수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
학창시절 고 김광주 명인과 인연 악기 제작 입문
반 백년 전통악기 생산 서동서 ‘광일국악사’ 운영
진도서 출토 요고 복원 "맥 끊길 걱정 없었으면"
학창시절 고 김광주 명인과 인연 악기 제작 입문
반 백년 전통악기 생산 서동서 ‘광일국악사’ 운영
진도서 출토 요고 복원 "맥 끊길 걱정 없었으면"
입력 : 2023. 06. 01(목) 18:23

이복수 악기장은 “악기장의 맥이 끊길까 걱정스럽다.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하다”며 “‘우리 것’의 가치를 높이는 관련 법이 제도화돼 전통 명인, 명장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석산 오동나무. 그는 이 나무를 찾아 전국을 돈다. 12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가장 추운 날씨에 이 산 저 산을 헤매느라 몸은 무겁지만 그의 마음은 가볍다. 편히 자랄 수 있는 흙을 뒤로 하고 돌무리 사이에 어렵게 자리 잡은 나무를 발견하면 그는 나무의 표면에 손을 대 홀로 꿋꿋히 비바람을 견뎠을 인고의 시간을 고스란히 느낀다.
품을 들여 어렵게 구한 나무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악기로 탄생한다.
전통악기를 만드는 기능을 보유한 이복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의 이야기다. 올해 70세가 된 그는 50여 년간 전통악기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고 김광주 선생의 문하에서 국악기 제작을 익혀 김명칠 김광주 최동식, 조정삼 이복수로 이어지는 악기장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는 가야금과 거문고, 북, 장구, 해금, 태평소 등 전통악기 68종 100여 가지 가운데 27종 50여 가지를 만든다.
현악기 중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이 주요 작품이다. 악기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의 선정과 벌채부터 나무의 진을 빼는 염장, 자연 통풍과 건조,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그를 최근 남구 서동 ‘광일국악사’에서 만났다. 가게 내부는 가야금과 북, 장구 등과 그 재료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곳에서 주로 전통악기를 판매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한다. 2층으로 올라가니 전통악기의 주재료인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벽에 기대있었다.
가야금과 거문고 등이 만들어졌을 작업대와 대패, 망치, 끌, 자 등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는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이라는 글씨가 크게 걸렸다. 맞은 편에는 그의 빛나는 업적들이 빼곡했다.
공간을 둘러보는데 이 악기장이 작업실 밖 베란다 쪽으로 안내했다. 독특한 향이 났다. 그 안으로 몇 발짝 들어서다 앞서 걷던 그가 불을 켜자 그제서야 켜켜이 쌓인 건조과정의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옆으로는 숙성 중인 나무들이 즐비했다.

 “악기를 만들기 위해 구한 나무들의 경우 뙤약볕은 물론이고 거센 눈과 비바람을 겪은 것들이에요. 토양이 좋지 못한 환경 등 혹독한 곳에서 자라야 나무가 단단하고 깊은 울림과 떨림을 낼 수 있죠. 우리 삶과 닮았달까요. 젊었을 적에는 기술이 좋은 악기를 좌우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좋은 악기가 되려면 재료가 다한다는 생각입니다.”
“악기를 만들기 위해 구한 나무들의 경우 뙤약볕은 물론이고 거센 눈과 비바람을 겪은 것들이에요. 토양이 좋지 못한 환경 등 혹독한 곳에서 자라야 나무가 단단하고 깊은 울림과 떨림을 낼 수 있죠. 우리 삶과 닮았달까요. 젊었을 적에는 기술이 좋은 악기를 좌우하는 줄 알았는데 나이가 들면서는 좋은 악기가 되려면 재료가 다한다는 생각입니다.”
이 악기장은 사실 농악단에 입단하면서 먼저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전북 완주 소양면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14세에 큰 형을 따라 농악단에 입단해 전국을 유랑했다. 상모돌리기와 줄타기 등 재주를 부리며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도 했다.
학업을 잇고 싶었던 그는 농악대를 빠져나와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다 고 김광주 선생 눈에 띠어 작업소에서 끌과 칼을 갈거나 허드렛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도 마칠 수 있었다.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사이클에 매진했으나 프로가 되려던 때 후원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 버리자 방황하다 군대를 다녀온 뒤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 선생에 인사를 갔다가 전통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전통악기를 만드는 일은 학창시절 어깨너머로 익힌 상태여서 어려움 없이 바로 제작하는 게 가능했다. 최동식 선생으로부터는 거문고 제작법을 이수했다.
그러다 독립이 하고 싶었던 그는 30대 초반 광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다. 전통 악기 제작에 몰두한 끝에 2010년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이 됐다.
“어릴 적에는 제가 전통악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전북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으니까 사이클 선수는 예상했지만요. 돌고 돌아 악기장이 된 셈이죠. 돌이켜보면 전 제가 처한 상황에서 늘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이 악기장은 전통악기 제작 외에도 이곳에서 사람들에 소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는 울림창악연구회 창단멤버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다.

 악기장으로 국악사를 운영하면서 예전 농악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만나 소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소리를 배워 판소리고법 교육 자격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예능과 기능을 두루 겸비했다 할 수 있다.
악기장으로 국악사를 운영하면서 예전 농악단에서 활동했던 분들을 만나 소리를 해보라는 권유를 받고 소리를 배워 판소리고법 교육 자격을 받아 봉사하고 있다. 예능과 기능을 두루 겸비했다 할 수 있다.
이외에 그는 전통악기 발굴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삼국시대 초기 토기, 고려시대 청자류 등 유물 500여 점 가운데 용도를 알 수 없던 이형도기 2점을 장고의 원형인 요고(허리가 잘록한 장구)로 추정하며 복원하기도 했다.
몇 년 사이 이 악기장은 악기장의 맥이 끊길까 걱정이 늘었다.
전국에 퍼져있는 몇몇 제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국악사를 닫았고, 자식들은 전통악기 제작을 배웠지만 현실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전통을 지켜온 기능인과 예능인은 많지만 전통악기를 배우고 만드는 사람들은 줄고 있는 게 현실이죠.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재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래 걸리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없어 악기장의 맥이 끊길까 걱정스럽죠.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하달까요. ‘우리 것’의 가치를 높이는 관련 법이 제도화돼 전통 명인, 명장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합니다.”
품을 들여 어렵게 구한 나무는 10년이라는 시간을 거쳐 마침내 그의 손끝에서 악기로 탄생한다.
전통악기를 만드는 기능을 보유한 이복수 광주시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의 이야기다. 올해 70세가 된 그는 50여 년간 전통악기 제작에 매진하고 있다.
고 김광주 선생의 문하에서 국악기 제작을 익혀 김명칠 김광주 최동식, 조정삼 이복수로 이어지는 악기장의 계보를 잇고 있다. 그는 가야금과 거문고, 북, 장구, 해금, 태평소 등 전통악기 68종 100여 가지 가운데 27종 50여 가지를 만든다.
현악기 중 가야금, 거문고, 아쟁, 해금이 주요 작품이다. 악기 제작에 사용되는 나무의 선정과 벌채부터 나무의 진을 빼는 염장, 자연 통풍과 건조, 제작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통 방식 그대로 하고 있다.
이런 그를 최근 남구 서동 ‘광일국악사’에서 만났다. 가게 내부는 가야금과 북, 장구 등과 그 재료들로 가득했다. 그는 이곳에서 주로 전통악기를 판매하거나 간단한 수리를 한다. 2층으로 올라가니 전통악기의 주재료인 나무들이 질서정연하게 벽에 기대있었다.
가야금과 거문고 등이 만들어졌을 작업대와 대패, 망치, 끌, 자 등이 펼쳐져 있고 그 위로는 ‘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이라는 글씨가 크게 걸렸다. 맞은 편에는 그의 빛나는 업적들이 빼곡했다.
공간을 둘러보는데 이 악기장이 작업실 밖 베란다 쪽으로 안내했다. 독특한 향이 났다. 그 안으로 몇 발짝 들어서다 앞서 걷던 그가 불을 켜자 그제서야 켜켜이 쌓인 건조과정의 나무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 옆으로는 숙성 중인 나무들이 즐비했다.

판소리고법 이수자로 활동 중인 이 악기장이 ‘홀로 아리랑’을 부르는 모습

이복수 악기장이 숙성시켜놓은 나무를 고르는 모습
이 악기장은 사실 농악단에 입단하면서 먼저 국악과 인연을 맺었다.
전북 완주 소양면에서 태어난 그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탓에 14세에 큰 형을 따라 농악단에 입단해 전국을 유랑했다. 상모돌리기와 줄타기 등 재주를 부리며 전통악기를 연주하고 소리도 했다.
학업을 잇고 싶었던 그는 농악대를 빠져나와 주간에 일을 하고 야간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게 된다. 그러다 고 김광주 선생 눈에 띠어 작업소에서 끌과 칼을 갈거나 허드렛일을 하면서 검정고시로 중학교 과정을 마치고 고등학교 과정도 마칠 수 있었다.
운동을 좋아해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는 사이클에 매진했으나 프로가 되려던 때 후원사가 경영이 어려워지는 상태가 돼 버리자 방황하다 군대를 다녀온 뒤 서울에서 활동하는 김 선생에 인사를 갔다가 전통악기를 제작하는 일을 시작하게 된다.
전통악기를 만드는 일은 학창시절 어깨너머로 익힌 상태여서 어려움 없이 바로 제작하는 게 가능했다. 최동식 선생으로부터는 거문고 제작법을 이수했다.
그러다 독립이 하고 싶었던 그는 30대 초반 광주로 내려와 터를 잡았다. 전통 악기 제작에 몰두한 끝에 2010년 광주시무형문화재 제12호 악기장이 됐다.
“어릴 적에는 제가 전통악기를 만드는 일에 종사할 거라고는 생각 못했습니다. 전북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해 은메달을 땄으니까 사이클 선수는 예상했지만요. 돌고 돌아 악기장이 된 셈이죠. 돌이켜보면 전 제가 처한 상황에서 늘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이 악기장은 전통악기 제작 외에도 이곳에서 사람들에 소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는 울림창악연구회 창단멤버이자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고법 이수자다.

작업실 전경

전통문화관에서 열린 ‘무등울림’ 행사 당시 강연을 마치고 사람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이 악기장
이외에 그는 전통악기 발굴 및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진도 명량대첩로해역 수중발굴조사를 통해 발굴된 삼국시대 초기 토기, 고려시대 청자류 등 유물 500여 점 가운데 용도를 알 수 없던 이형도기 2점을 장고의 원형인 요고(허리가 잘록한 장구)로 추정하며 복원하기도 했다.
몇 년 사이 이 악기장은 악기장의 맥이 끊길까 걱정이 늘었다.
전국에 퍼져있는 몇몇 제자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운영하던 국악사를 닫았고, 자식들은 전통악기 제작을 배웠지만 현실적 문제 등으로 현재는 종사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다. 그는 마지막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전통을 지켜온 기능인과 예능인은 많지만 전통악기를 배우고 만드는 사람들은 줄고 있는 게 현실이죠. 좋은 악기를 만들려면 재료를 선별하는 방법을 배우고 기술을 배우는 과정, 또 그것을 자기 것으로 체화시킬 시간이 필요하기에 오래 걸리거든요. 하려는 사람이 없어 악기장의 맥이 끊길까 걱정스럽죠. 전통문화를 사랑하는 여러 사람들의 관심이 절실하달까요. ‘우리 것’의 가치를 높이는 관련 법이 제도화돼 전통 명인, 명장들의 처우가 개선됐으면 합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