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 안팎 풍경 다독이며 고요의 시간 펼치다
1984년 등단 데뷔 40년 고재종 10시집 ‘독각’
‘근원적 삶의 본질’에 대한 무한한 물음 표출도
‘근원적 삶의 본질’에 대한 무한한 물음 표출도
입력 : 2023. 02. 19(일) 18: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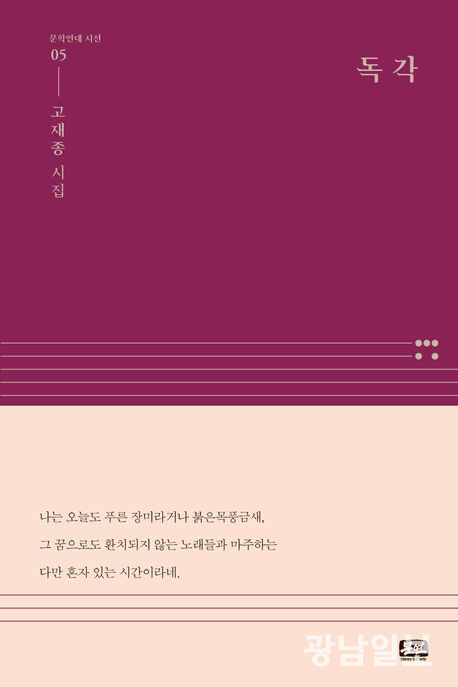
시집 ‘독각’ 표지
열 번째 시집을 맞이하는 시인의 시적 성취나 그 깊이는 아우를 수 없다. 평생 시라고 하는 텃밭에서 그 텃밭을 일구며 보내온 삶에 온통 푸른 시가 넘실거렸을테다. 시인이 한 삶을 관통해오면서 얻은 것은 무엇일까. 쉬운 일상의 말로는 고요한 일상을 일군 것이겠으나 성찰 끝 깨침이 더 적확한 표현이 아닐까 싶다.
일상의 시인과 문학 속 시인은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 삶의 속박에 대처하는 태도나 품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대화를 못 나눌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학 속 시인은 큰 산 같기도 하고, 때론 큰 바다 같기도 하다. 같은 시단을 뒹구는 문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이 같을 수는 없다. 이 지역에서 그는 그런 시인의 결을 지녔다. 이번에 나온 시집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그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고향 담양에서 광주로, 다시 담양으로 돌아가 이순 넘어 그의 시선 앞에서 펼쳐진 세상은 돌올한 높이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눈길을 줄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하지만 삶은 깊어져 풍요로워질듯한데 오히려 외롭다. 마음은 곳곳에 요란했던 날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결 적막 앞 차분한 호흡으로 자리한다. 담양 수북 궁산마을에서 창작을 하며 일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재종 시인이 그다. 1984년 실천문학사의 신작시집 ‘시여 무기여’에 ‘동구 밖 집 열 두 식구’를 발표하며 등단, 올해 데뷔 40년을 맞은 그가 현재적 시간을 투영한 듯한 시집 ‘독각’(문학연대 刊)을 펴냈다. 독각(獨覺)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해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온갖 치장을 다하고 있는 제목들이 넘쳐나는 시단에서 강렬한 인상을 새긴다.
 최영철 시인이 표사에서 ‘정겹고 맛깔스러운 그의 시는 전라도의 흥과 애가 자아낸 특산물’이라 했듯 늘 그의 시가 갖는 영역은 농촌시의 대표시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것은 분류에 의한 접근일 뿐이고, 사실은 인간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인의 시적 촉수가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최영철 시인이 표사에서 ‘정겹고 맛깔스러운 그의 시는 전라도의 흥과 애가 자아낸 특산물’이라 했듯 늘 그의 시가 갖는 영역은 농촌시의 대표시인으로 꼽혔다. 그러나 그것은 분류에 의한 접근일 뿐이고, 사실은 인간에 의해 훼손당하지 않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표현하는 시인의 시적 촉수가 폭넓게 포진해 있다는 것이다.
어쩌면 이번 시집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근원과 본질에 대한 물음을 통해 스스로 깨친 영역의 것들이 아닐까 여겨진다.
‘혼자 넘는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15편의 작품은 요란했던 삶의 시간을 뒤로 하고, 홀로 맞아들이는 근래의 정경들을 마음 안팎을 넘나들며 차분한 어조로 노래한다.
‘바깥을 닫아건 고요와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침묵이, 마주 앉은 시간의 창에 어른거린다. 창으로는 잊을 만하면 스며드는 밤새 울음, 그만큼이나 하나의 세계를 갈구하는 병은 내 상처를 먹고 자라는 수정난풀과도 같다. 그것은 또 우울한 몽상 위로 치켜든 염화미소처럼이나 기어코는 닿지 못하는, 세계의 무한거울 방!’
 위 시는 ‘혼자넘는 시간 4’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댓잎귀신들이 수묵을 친다’라는 전반부 구절이다. 그가 맞이한 일상이 얼마나 고요한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를 지배하는 것들은 외적으로는 고요이고, 내적으로는 침묵과 대면하는 일상이다. 그를 지나는 시간은 결국 닿지 못하는 공간으로 흘러간다. 염화미소(拈華微笑)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울한 몽상 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40여 년 창작인으로의 삶 끝에 마주하는 세계인 듯 읽힌다. 그에 앞서 ‘솔새의 연주’ 또한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하겠다.
위 시는 ‘혼자넘는 시간 4’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댓잎귀신들이 수묵을 친다’라는 전반부 구절이다. 그가 맞이한 일상이 얼마나 고요한가를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를 지배하는 것들은 외적으로는 고요이고, 내적으로는 침묵과 대면하는 일상이다. 그를 지나는 시간은 결국 닿지 못하는 공간으로 흘러간다. 염화미소(拈華微笑)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하는 일을 의미한다. 그런데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우울한 몽상 위를 지나가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40여 년 창작인으로의 삶 끝에 마주하는 세계인 듯 읽힌다. 그에 앞서 ‘솔새의 연주’ 또한 궤를 함께 하고 있다 하겠다.
그러면서 인간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자각 또한 드러낸다.
시인은 ‘그 바람 페이지를 넘기며 서글픈 인생을 고찰해 보지만 동안거에 든 나목 한 그루 해독할 수 없다는 건 오래된 진실’(‘바람과 함께 숲 길을 걷는 일에 대하여-혼자 넘는 시간 14’ 일부)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그의 시편들 일부 행간은 이순 넘어 그가 도달한 깨침 혹은 깨달음의 선시와 흡사 유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고요한 일상 속 시인과 함께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표출한다.
멀리있는 자식보다 곁에 있는 고양이들이 낫다고 말해준 망백(望百, 백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아흔한 살)의 뒷집 할머니(‘동짓날’)나 40년 미장이 인생을 풀어놓는데 날밤이 구구절절 팽창했다는 ‘현장 소장 미장이 신충섭’, ‘오늘도 불끈 들어서 에어컨 앞에다 앉히는 아들네 자동차가 길 모퉁이를 돌기도 전, 허리에 팔자를 두르고 무릎엔 귀신을 찬채 텃밭으로 기고 구르는 장전댁을 누가 말리랴’(‘일귀신 장전댁’) 등이 그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인은 근원적 삶의 본질에 대한 무한한 물음을 던진다. 시인은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가/길 끝 너머에서도 길은 길일까’(‘길의 노래’)나 ‘길은 늘 가 닿지 못하는 길 바깥들,/가 닿아도 머물지 못하는 길 안쪽들’(‘다시 길의 노래’)이라고 읊는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인은 근원적 삶의 본질에 대한 무한한 물음을 던진다. 시인은 ‘지금 여기가 어디쯤인가/길 끝 너머에서도 길은 길일까’(‘길의 노래’)나 ‘길은 늘 가 닿지 못하는 길 바깥들,/가 닿아도 머물지 못하는 길 안쪽들’(‘다시 길의 노래’)이라고 읊는다.
시인에게 길은 이제 동행의 의미보다는 자신이 홀로 가는 듯한 의미를 새긴다. ‘영혼을 베어버린 면도날, 사랑을 외면하는 시선과/고단을 뒤집어쓴 남루. 혼자 넘는 자의 업보와/ 더는, 가 닿아야 할 곳에 대한 발고된 의심들’(‘다시 길의 노래’)에서 시인의 깨침 혹은 깨달음 같은 게 허투루 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시인이 언급한 시인의 말은 시적 흐름을 단박에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는 “이만큼에 서서 저만큼의 강을 물으며, 묵묵히 바라보는 경우가 잦다. 예전 어디선가 보았던 시간이 묵어 목전의 강물로 오는 것 같다. 황혼을 지피는 새들은 귀소를 서두르는가. 나는 약간은 처연하게 강 끝을 응시한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나에게서조차 잠시 물러난다”고 밝혔다.
일상의 시인과 문학 속 시인은 엄밀하게 보면 다르다. 삶의 속박에 대처하는 태도나 품성이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모두 다를 수 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에서 대화를 못 나눌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학 속 시인은 큰 산 같기도 하고, 때론 큰 바다 같기도 하다. 같은 시단을 뒹구는 문인이라 하더라도 그 결이 같을 수는 없다. 이 지역에서 그는 그런 시인의 결을 지녔다. 이번에 나온 시집은 한층 더 고요해졌다. 그저 말로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시적 깊이를 더하고 있다.
고향 담양에서 광주로, 다시 담양으로 돌아가 이순 넘어 그의 시선 앞에서 펼쳐진 세상은 돌올한 높이를 내려놓고 나지막이 눈길을 줄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하지만 삶은 깊어져 풍요로워질듯한데 오히려 외롭다. 마음은 곳곳에 요란했던 날들의 상처를 치유하면서 한결 적막 앞 차분한 호흡으로 자리한다. 담양 수북 궁산마을에서 창작을 하며 일상을 구가하고 있는 고재종 시인이 그다. 1984년 실천문학사의 신작시집 ‘시여 무기여’에 ‘동구 밖 집 열 두 식구’를 발표하며 등단, 올해 데뷔 40년을 맞은 그가 현재적 시간을 투영한 듯한 시집 ‘독각’(문학연대 刊)을 펴냈다. 독각(獨覺)은 부처의 가르침에 의하지 않고 혼자 수행해 깨달음을 얻거나 또는 그런 사람을 말한다. 온갖 치장을 다하고 있는 제목들이 넘쳐나는 시단에서 강렬한 인상을 새긴다.

고재종 시인(사진제공=고재종 시인)
어쩌면 이번 시집은 그보다 한발 더 나아가 근원과 본질에 대한 물음을 통해 스스로 깨친 영역의 것들이 아닐까 여겨진다.
‘혼자 넘는 시간’이라는 부제가 붙은 15편의 작품은 요란했던 삶의 시간을 뒤로 하고, 홀로 맞아들이는 근래의 정경들을 마음 안팎을 넘나들며 차분한 어조로 노래한다.
‘바깥을 닫아건 고요와 나의 내부를 들여다보는 침묵이, 마주 앉은 시간의 창에 어른거린다. 창으로는 잊을 만하면 스며드는 밤새 울음, 그만큼이나 하나의 세계를 갈구하는 병은 내 상처를 먹고 자라는 수정난풀과도 같다. 그것은 또 우울한 몽상 위로 치켜든 염화미소처럼이나 기어코는 닿지 못하는, 세계의 무한거울 방!’

서재에서 작업 중인 고재종 시인(사진제공=고재종 시인).
그러면서 인간으로 어쩌지 못하는 한계에 대한 자각 또한 드러낸다.
시인은 ‘그 바람 페이지를 넘기며 서글픈 인생을 고찰해 보지만 동안거에 든 나목 한 그루 해독할 수 없다는 건 오래된 진실’(‘바람과 함께 숲 길을 걷는 일에 대하여-혼자 넘는 시간 14’ 일부)이라고 규정한다.
이처럼 그의 시편들 일부 행간은 이순 넘어 그가 도달한 깨침 혹은 깨달음의 선시와 흡사 유사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아울러 고요한 일상 속 시인과 함께 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표출한다.
멀리있는 자식보다 곁에 있는 고양이들이 낫다고 말해준 망백(望百, 백을 바라본다는 뜻으로, 아흔한 살)의 뒷집 할머니(‘동짓날’)나 40년 미장이 인생을 풀어놓는데 날밤이 구구절절 팽창했다는 ‘현장 소장 미장이 신충섭’, ‘오늘도 불끈 들어서 에어컨 앞에다 앉히는 아들네 자동차가 길 모퉁이를 돌기도 전, 허리에 팔자를 두르고 무릎엔 귀신을 찬채 텃밭으로 기고 구르는 장전댁을 누가 말리랴’(‘일귀신 장전댁’) 등이 그것이다.

궁산 마을회관 앞에 앉은 고재종 시인(사진제공=고재종 시인)
시인에게 길은 이제 동행의 의미보다는 자신이 홀로 가는 듯한 의미를 새긴다. ‘영혼을 베어버린 면도날, 사랑을 외면하는 시선과/고단을 뒤집어쓴 남루. 혼자 넘는 자의 업보와/ 더는, 가 닿아야 할 곳에 대한 발고된 의심들’(‘다시 길의 노래’)에서 시인의 깨침 혹은 깨달음 같은 게 허투루 도달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드러낸다.
시인이 언급한 시인의 말은 시적 흐름을 단박에 엿볼 수 있는 지점이다. 그는 “이만큼에 서서 저만큼의 강을 물으며, 묵묵히 바라보는 경우가 잦다. 예전 어디선가 보았던 시간이 묵어 목전의 강물로 오는 것 같다. 황혼을 지피는 새들은 귀소를 서두르는가. 나는 약간은 처연하게 강 끝을 응시한다. 나는 서둘러 달려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나에게서조차 잠시 물러난다”고 밝혔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