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 융·복합’ 글과 그림에 투영된 백두대간
김종 시인 ‘자궁에서 왕관까지’ 출간
민족통일 염원 압축 화필에세이집
민족통일 염원 압축 화필에세이집
입력 : 2023. 02. 19(일) 15: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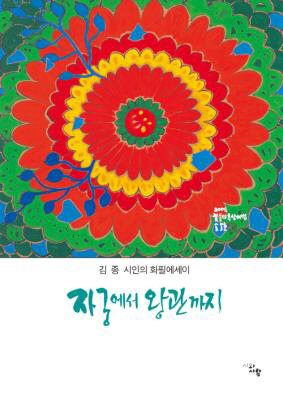
‘자궁에서 왕관까지’
50년 넘게 창작 생활을 해온 화가이자 시인 김종 작가의 화필에세이 ‘자궁에서 왕관까지’(시와사람 刊)가 최근 출간됐다.
회화는 시적 상상력의 토대에서 그려졌다는 측면에서 시인에게 시와 그림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시는 물론 에세이도 시적인 요소를 지닌다. 시인은 화폭에 색을 입히듯 글을 쓰며 활자로 표현, 글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이 됐다는 설명이다.
‘자궁에서 왕관까지’라는 화필에세이의 명칭에서 ‘자궁’은 한라산을, ‘왕관’은 백두산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몸과 자연을 연결, 상생(相生)의 관계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겨레의 가슴을 흐르는 국토통일, 민족통일에의 염원이 상징언어로 제시한 제목에 압축됐다.
표지는 꽃 또는 붉은 해를 연상시키는 ‘꽃들의 추상어법’이 장식했다. 책을 펼치면 가로 70cm에 달하는 그림 ‘월인천강을 거닐다’를 만날 수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꽃밭을 걷는 듯하게 구성됐다.
화필에세이는 ‘백두산 천지가 왕관이 된 사연’과 ‘계림에서 만난 산이 된 사람들’, ‘그리하여 인간의 다음 밥상은?’, ‘키가 자라는 산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김 시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유했던 예술적 직관과 창작의 시간들이 38편의 에세이와 회화로 집약됐다.
에세이 사이 사이에는 김종 시인의 그림들이 고향 어머니의 모습을 한 채 독자를 반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과 한 편의 시 같은 그림의 제목들, 그림과 그림 사이 어우러진 진솔한 문장들이 돋보인다.
특히 ‘신들의 구수회담’에서는 모든 산이 백두산 천지에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 달 혹은 태양으로 보이는 이미지 및 발가벗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원초적 생명성을 느낄 수 있다.
 시인은 “우리 국토는 산, 강, 들 어느 하나도 분리해낼 수 없는 유기적인 지체의 일부이기에 남북한은 신체적으로도 한 몸이며 정신 또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인은 “우리 국토는 산, 강, 들 어느 하나도 분리해낼 수 없는 유기적인 지체의 일부이기에 남북한은 신체적으로도 한 몸이며 정신 또한 하나가 될 수밖에 없는 숙명을 타고났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경호 평론가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사유는 잘 다듬어진 조각작품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는 견결한 역사의식과 근원을 발견해 가는 혜안, 서정과 서경으로 펼쳐낸 예술혼이 담겨 있다”면서 “예술의 융복합이라는 말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양식의 커다란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했다.
시인은 1966년 단국대 주최 전국고교 시조 현상공모에 당선됐고 1971년 제8회 월간문학 신인상과 시조문학 추천을 받았다.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장미원’이 당선, 시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문인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광주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 민족시가대상, 새천년문학대상, 영랑문학대상, 한국펜문학상, 한국가사문학대상, 백호임제문학상 본상, 박용철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장미원’과 ‘밑불’, ‘그대에게 가는 연습’, ‘간절한 대륙’ 등을 펴냈다. 이외에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초대작가, 한국추사서예대전의 초청작가, 서예계의 최고 권위인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회화는 시적 상상력의 토대에서 그려졌다는 측면에서 시인에게 시와 그림은 한 몸이나 다름없다. 시는 물론 에세이도 시적인 요소를 지닌다. 시인은 화폭에 색을 입히듯 글을 쓰며 활자로 표현, 글이 그림이 되고 그림이 글이 됐다는 설명이다.
‘자궁에서 왕관까지’라는 화필에세이의 명칭에서 ‘자궁’은 한라산을, ‘왕관’은 백두산을 의미한다는 설명이다. 몸과 자연을 연결, 상생(相生)의 관계를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겨레의 가슴을 흐르는 국토통일, 민족통일에의 염원이 상징언어로 제시한 제목에 압축됐다.
표지는 꽃 또는 붉은 해를 연상시키는 ‘꽃들의 추상어법’이 장식했다. 책을 펼치면 가로 70cm에 달하는 그림 ‘월인천강을 거닐다’를 만날 수 있다. 책장을 넘길 때마다 꽃밭을 걷는 듯하게 구성됐다.
화필에세이는 ‘백두산 천지가 왕관이 된 사연’과 ‘계림에서 만난 산이 된 사람들’, ‘그리하여 인간의 다음 밥상은?’, ‘키가 자라는 산들’ 등 총 4부로 구성됐다. 김 시인이 그림을 그리면서 사유했던 예술적 직관과 창작의 시간들이 38편의 에세이와 회화로 집약됐다.
에세이 사이 사이에는 김종 시인의 그림들이 고향 어머니의 모습을 한 채 독자를 반긴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림과 한 편의 시 같은 그림의 제목들, 그림과 그림 사이 어우러진 진솔한 문장들이 돋보인다.
특히 ‘신들의 구수회담’에서는 모든 산이 백두산 천지에 머리를 맞대고 회의하는 모습, 달 혹은 태양으로 보이는 이미지 및 발가벗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원초적 생명성을 느낄 수 있다.

김종 시인
강경호 평론가는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 사유는 잘 다듬어진 조각작품을 보는 듯하다. 여기에는 견결한 역사의식과 근원을 발견해 가는 혜안, 서정과 서경으로 펼쳐낸 예술혼이 담겨 있다”면서 “예술의 융복합이라는 말처럼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양식의 커다란 지평을 여는 계기가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평했다.
시인은 1966년 단국대 주최 전국고교 시조 현상공모에 당선됐고 1971년 제8회 월간문학 신인상과 시조문학 추천을 받았다. 1976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시 ‘장미원’이 당선, 시작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광주문인협회장을 지내기도 한 그는 광주시민대상 문화예술부문, 민족시가대상, 새천년문학대상, 영랑문학대상, 한국펜문학상, 한국가사문학대상, 백호임제문학상 본상, 박용철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시집 ‘장미원’과 ‘밑불’, ‘그대에게 가는 연습’, ‘간절한 대륙’ 등을 펴냈다. 이외에 대한민국 동양서예대전의 초대작가, 한국추사서예대전의 초청작가, 서예계의 최고 권위인 ‘추사 김정희선생 추모 전국휘호대회’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