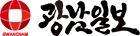[독자권익위원 칼럼]기본과 기준의 차이
이지안 에이아이티브 대표
입력 : 2026. 02. 10(화) 11:29
본문 음성 듣기
가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말은 오래된 원칙이자, 사회가 안전하고 규칙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만든 약속이다. 그러나 이 문장이 현실에서도 같은 무게로 작동하고 있는지 묻는 순간, 대답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최근의 판결 몇 가지를 같은 선상에 놓고 바라보면, 법은 모두에게 같은 기본을 요구하는 듯 보이지만 적용되는 기준은 서로 다른 것처럼 느껴진다. 시민들의 분노와 허탈감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다.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러한 의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률적으로 보면 각 혐의별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내린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법리의 세부가 아니라 결과의 무게였다.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제기된 사건의 결론치고는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판결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의 숫자 자체보다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체감이 문제였다. 권력과 명성이 얽힌 사건에서 법은 유난히 신중하고 포용적으로 보인다.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듯하지만, 최종 판단은 모호하다 못해 관대하기까지 하다. 반면 시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이 훨씬 단호하고 결과까지 엄격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비는 반복되는 사례를 통해 단순한 짐작에 그치지 않고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
한 예로, 전북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시민의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승객에게 받은 현금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라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은 아니었지만, 그 판결이 남긴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 단돈 2400원으로 일터를 잃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생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신뢰’라는 말은 법적으로 타당했을지 몰라도 삶의 무게 앞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졌다.
또다른 예로,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 보안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빵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사법 정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형사 피고인이 됐고 직장과 사회적 평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 사건들을 법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 적용된 법률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며, 사건의 성격 역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법률적 구분과는 다른 차원이다. 권력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법이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작동하는 반면, 평범한 시민의 실수와 일상에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증거의 미세한 균열이 무죄로 이어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사소한 금전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든다.
결국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왜 누구에게는 법이 이렇게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엄격한가. 수사에 착수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기소 여부는 어떤 사건에서 더 쉽게 결정되는가. 비싼 변호사를 쓸수록 승률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특정 사건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속에서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법이 신뢰를 잃는 순간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아니다. 같은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껴질 때다. 시민이 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는 순간은, 법이 공정하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 기본과 기준은 모두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다. 기득권의 범죄는 법리의 숲속으로 들어가고 시민의 실수는 곧바로 삶의 위협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과 기준이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동체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시민들은 법을 믿지 않고 대신 의심한다. 그 의심이 쌓일수록 사회는 거칠어지고 갈등은 깊어진다.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어야 한다. 최소한 강한 자에게 더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더 엄격하다는 의심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다.
김건희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이러한 의문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법원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명품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무상 여론조사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법률적으로 보면 각 혐의별로 증거와 구성요건을 따져 내린 판단일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이 받아들인 것은 법리의 세부가 아니라 결과의 무게였다. 명품 수수와 주가조작 의혹이라는 중대한 사안이 제기된 사건의 결론치고는 형량이 ‘너무나 가볍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이 판결이 사회적 논란으로 번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 1년 8개월이라는 형량의 숫자 자체보다 법이 작동하는 방식에 대한 체감이 문제였다. 권력과 명성이 얽힌 사건에서 법은 유난히 신중하고 포용적으로 보인다. 증거를 엄격하게 따지는 듯하지만, 최종 판단은 모호하다 못해 관대하기까지 하다. 반면 시민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건에서는 법이 훨씬 단호하고 결과까지 엄격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대비는 반복되는 사례를 통해 단순한 짐작에 그치지 않고 확신처럼 굳어지고 있다.
한 예로, 전북에서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던 한 시민의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승객에게 받은 현금 요금 중 2400원을 회사에 입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횡령 금액의 많고 적음과 관계없이 신뢰 관계를 훼손했다”라며 해고를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형사처벌은 아니었지만, 그 판결이 남긴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았다. 단돈 2400원으로 일터를 잃었고, 그동안 쌓아온 경력과 생계가 동시에 무너졌다. ‘신뢰’라는 말은 법적으로 타당했을지 몰라도 삶의 무게 앞에서는 지나치게 가혹하게 느껴졌다.
또다른 예로, ‘초코파이 절도 사건’도 시민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다. 한 보안업체 직원이 회사 냉장고에 있던 초코파이와 카스타드 빵 등 총 1050원 상당의 간식을 꺼내 먹었다는 이유로 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는 절도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됐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사법 정의가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개인은 형사 피고인이 됐고 직장과 사회적 평판, 미래에 대한 불안을 감내해야 했다.
이 사건들을 법적으로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라고 할 수도 있다. 적용된 법률도 다르고 판단 기준도 다르며, 사건의 성격 역시 동일하지 않다. 그러나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은 법률적 구분과는 다른 차원이다. 권력과 가까운 사건에서는 법이 복잡하고 조심스럽게 작동하는 반면, 평범한 시민의 실수와 일상에서는 ‘원칙’과 ‘신뢰’라는 이름으로 즉각적인 제재가 가해진다는 점이다. 어떤 사건에서는 증거의 미세한 균열이 무죄로 이어지고, 어떤 사건에서는 사소한 금전 문제가 삶 전체를 흔든다.
결국 시민들이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다. 왜 누구에게는 법이 이렇게 관대하고, 누구에게는 이렇게 엄격한가. 수사에 착수되는 기준은 무엇이며, 기소 여부는 어떤 사건에서 더 쉽게 결정되는가. 비싼 변호사를 쓸수록 승률을 보장받는 구조는 아닌가. 이러한 질문들은 특정 사건 하나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반복된 경험 속에서 누적된 문제의식이다.
법이 신뢰를 잃는 순간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아니다. 같은 사회에서 전혀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고 느껴질 때다. 시민이 법 앞에서 고개를 숙이지 않게 되는 순간은, 법이 공정하다고 믿지 못하게 되는 순간과 맞닿아 있다. 기본과 기준은 모두 같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법은 보호 장치가 아니라 불신의 대상이 된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법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을 누구에게나 같은 높이의 기준으로 적용하려는 최소한의 일관성이다. 기득권의 범죄는 법리의 숲속으로 들어가고 시민의 실수는 곧바로 삶의 위협으로 돌아오는 구조가 반복된다면, 법치에 대한 신뢰는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다.
기본과 기준이 다르다는 인식이 굳어지는 순간, 법은 더 이상 공동체의 최후 보루가 아니다. 시민들은 법을 믿지 않고 대신 의심한다. 그 의심이 쌓일수록 사회는 거칠어지고 갈등은 깊어진다. 법은 누구의 편도 아니어야 한다. 최소한 강한 자에게 더 관대하고 약한 자에게 더 엄격하다는 의심만큼은 남기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법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품격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