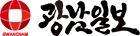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집중
김령 제2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 펴내
"문득 낯선 우리 삶에 대해 주목"…55편 수록
"문득 낯선 우리 삶에 대해 주목"…55편 수록
입력 : 2026. 02. 02(월) 18:33
본문 음성 듣기
가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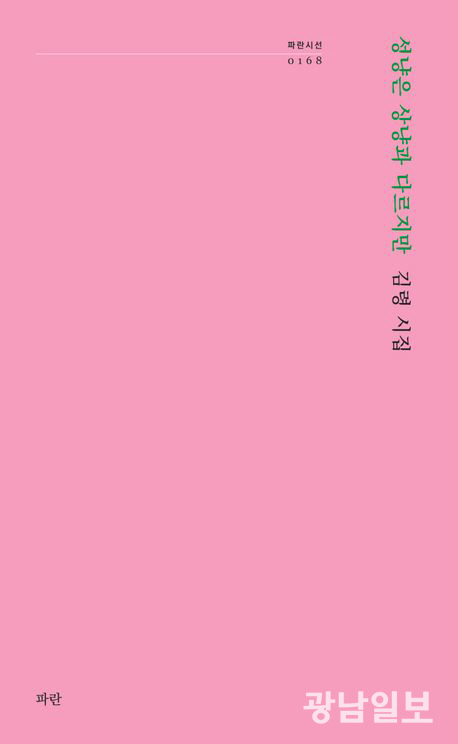
김령 시집
고흥 출생 김령 시인이 두 번째 시집 ‘성냥은 상냥과 다르지만’을 파란 시선 168번째 권으로 펴냈다.
“아이의 표정도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이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시 표정은 결코 알 수 없는 표정들에 대한 고심이 역력하게 포착된다. 그의 시편들은 명쾌한 해석보다는 무언가 무릎을 치며 깨닫기를 갈구한다. 한결같이 시편들이 정연하게 흘러가지만 결론부에서 울림을 강하게 가져간다. 도입부에서는 그닥 시가 맛있거나 심오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론부에 도달하면 시인이 이런 울림을 주기 위해 흐름 혹은 시상 전개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든다.
표제에서 성냥과 상냥은 시 ‘성냥을 사야 할까’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비슷한 발음의 중첩을 통해 언어유희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중첩의 의미에 기대 시상을 전개해 가지는 않는다. 성냥의 소유로부터 불길, 불길 전후 존재에 대한 탐구 등 성냥으로 촉발된 사유를 차분히 정리한다.
이처럼 시인의 시들은 서정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와는 결을 달리한다. 시의 전체적 무게 중심을 결론부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떡 보살’과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 같은 시편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시인은 ‘호떡 보살’을 통해 ‘산신보살 선녀보살 천수보살 천녀보살 장군보살 아라보살 약사보살 애기보살 애동보살 계룡보살 청룡보살/사이, 붉은 리본 내건 호떡보살/저 등등한 신들 틈 저이는 어쩌다 호떡 보살을 모시게 되었을까 찌르르한 신들 사이 호떡 신을 모시고 어쩌자는 걸까/놀이 못하는 애와 짝이 되면 미리 기가 죽었는데 고스톱에서조차 나쁜 패를 받아 들면 심장이 조이는데/자신의 입만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호떡보살을 모신 저이는 뭐라고 하나/산신은 근엄하게 호통치면서 천녀보살은 천상의 음성으로 애기보살 애동보살은 애교를 부리며 일러 줄 텐데 호떡보살은 뭐라고 점괘를 알려 줄까나/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 더듬더듬 호떡보살을 찾는 동굴 같은 눈빛 앞에서’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하늘은 신계인 듯하다. 신계 역시 곡선의 삶은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에서 기발한 또는 맛있는 점괘를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산신보살이나 선녀보살 같은 흔한 보살이 아닌, 호떡 보살은 오늘날 부조리한 시대, 점괘로 내려보내기 어려운 운명들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진지하기보다는 잠시 가벼운 마음에 가닿게 한다. 어쩌면 시적 자아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친근한 보살로 그 해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무언가 의미를 반죽해놓고 반듯하게 절단하는 것이 아닌,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형체를 통해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또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은 비유나 설명이 늘어져 시적 긴장감을 상실하는 시편들도 난무하는 세태 속 압축과 압축을 거듭해 강렬하고 내밀한 시적 긴장과 울림을 확보한다. 짧지만 시적 의미망이 나이테처럼 깊이를 더하며 파고드는 형국이다. 시인은 ‘사향쥐는 덫에 걸리면/다리를 물어뜯어 잘라 낸다/오른쪽 발목이 가렵다’고 읊는다.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그 울림의 깊이는 결론부에서 최고 정점을 찍는 듯하다.
이외에 ‘옻나무가 있는 집’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뿐인 아들 앞세우고/먼 산을 보며 밥을 먹는다/옻나무에 앉아 건너다보는/까마귀 몫을 남긴다’고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적 자아는 죽은 아들이 있는 먼 산을 응시하며, 살아있음을 위해 식사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까마귀는 자신이 있는 곳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 시적 자아가 있는 곳을 자유가 부재하기에 죽음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다시 시적 자아는 자신과 까마귀를 동일선상에 놓아두고 ‘먼 산’과 ‘옻나무’라고 하는 든든한 동일 지점을 확보한다.
시인의 시편들은 쉽게 절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론부에 가서 시적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시 ‘숲속에 누군가 있었네’와 ‘산다’, ‘거기’ 등 55편이 실려 있다.
남승원 문학평론가는 해설 ‘가볍게 건네는 안부’를 통해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삶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그래서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꽉 껴안은 모습 그대로의 고통 말이다”라면서 “문득 낯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시인은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령 시인은 전남 고흥 출생으로 2017년 계간 ‘시와 경계’로 등단,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를 펴냈고, 토지 문학제 평사리 문학 대상을 수상했다.
“아이의 표정도 애매할 때가 있다는 것을 아이일 때는 결코 알 수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시인의 시 표정은 결코 알 수 없는 표정들에 대한 고심이 역력하게 포착된다. 그의 시편들은 명쾌한 해석보다는 무언가 무릎을 치며 깨닫기를 갈구한다. 한결같이 시편들이 정연하게 흘러가지만 결론부에서 울림을 강하게 가져간다. 도입부에서는 그닥 시가 맛있거나 심오하지 않아 보이지만 결론부에 도달하면 시인이 이런 울림을 주기 위해 흐름 혹은 시상 전개를 이렇게 가져갔구나 하고 느끼도록 만든다.
표제에서 성냥과 상냥은 시 ‘성냥을 사야 할까’에서 발췌한 것이지만 비슷한 발음의 중첩을 통해 언어유희를 느끼게 한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히려 중첩의 의미에 기대 시상을 전개해 가지는 않는다. 성냥의 소유로부터 불길, 불길 전후 존재에 대한 탐구 등 성냥으로 촉발된 사유를 차분히 정리한다.
이처럼 시인의 시들은 서정의 순차적 흐름에 따른 시상의 전개와는 결을 달리한다. 시의 전체적 무게 중심을 결론부에 두고 있다. 대표적으로 ‘호떡 보살’과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 같은 시편들이 이에 해당한다.
먼저 시인은 ‘호떡 보살’을 통해 ‘산신보살 선녀보살 천수보살 천녀보살 장군보살 아라보살 약사보살 애기보살 애동보살 계룡보살 청룡보살/사이, 붉은 리본 내건 호떡보살/저 등등한 신들 틈 저이는 어쩌다 호떡 보살을 모시게 되었을까 찌르르한 신들 사이 호떡 신을 모시고 어쩌자는 걸까/놀이 못하는 애와 짝이 되면 미리 기가 죽었는데 고스톱에서조차 나쁜 패를 받아 들면 심장이 조이는데/자신의 입만 간절히 바라보는 이들에게 호떡보살을 모신 저이는 뭐라고 하나/산신은 근엄하게 호통치면서 천녀보살은 천상의 음성으로 애기보살 애동보살은 애교를 부리며 일러 줄 텐데 호떡보살은 뭐라고 점괘를 알려 줄까나/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 더듬더듬 호떡보살을 찾는 동굴 같은 눈빛 앞에서’라고 노래한다.
여기서 하늘은 신계인 듯하다. 신계 역시 곡선의 삶은 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도 골목처럼 구부러져 막다른 곳’에서 기발한 또는 맛있는 점괘를 기다리는지도 모를 일이다. 산신보살이나 선녀보살 같은 흔한 보살이 아닌, 호떡 보살은 오늘날 부조리한 시대, 점괘로 내려보내기 어려운 운명들만을 예측하는 것으로 진지하기보다는 잠시 가벼운 마음에 가닿게 한다. 어쩌면 시적 자아는 예측하기 어려운 미래, 친근한 보살로 그 해법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닐까 싶다. 무언가 의미를 반죽해놓고 반듯하게 절단하는 것이 아닌, 흥건하게 흘러내리는 듯한 형체를 통해 여러 생각거리를 안겨준다.
또 ‘오른쪽 발목의 가려움증’은 비유나 설명이 늘어져 시적 긴장감을 상실하는 시편들도 난무하는 세태 속 압축과 압축을 거듭해 강렬하고 내밀한 시적 긴장과 울림을 확보한다. 짧지만 시적 의미망이 나이테처럼 깊이를 더하며 파고드는 형국이다. 시인은 ‘사향쥐는 덫에 걸리면/다리를 물어뜯어 잘라 낸다/오른쪽 발목이 가렵다’고 읊는다. 굉장히 짧은 시이지만 그 울림의 깊이는 결론부에서 최고 정점을 찍는 듯하다.
이외에 ‘옻나무가 있는 집’ 역시 마찬가지다. ‘하나뿐인 아들 앞세우고/먼 산을 보며 밥을 먹는다/옻나무에 앉아 건너다보는/까마귀 몫을 남긴다’고 시상이 전개되고 있는데 시적 자아는 죽은 아들이 있는 먼 산을 응시하며, 살아있음을 위해 식사를 한다. 이와는 반대로 까마귀는 자신이 있는 곳을 살아있는 공간으로 인식, 시적 자아가 있는 곳을 자유가 부재하기에 죽음의 공간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다시 시적 자아는 자신과 까마귀를 동일선상에 놓아두고 ‘먼 산’과 ‘옻나무’라고 하는 든든한 동일 지점을 확보한다.
시인의 시편들은 쉽게 절정을 드러내지 않는다. 결론부에 가서 시적 긴장감을 최대로 끌어올린다.
이번 시집은 제4부로 구성, 시 ‘숲속에 누군가 있었네’와 ‘산다’, ‘거기’ 등 55편이 실려 있다.
남승원 문학평론가는 해설 ‘가볍게 건네는 안부’를 통해 “시인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현실적 삶을 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존재 자체를 부인당하는 고통의 모습들이다. 어쩌면 우리는 끝내 그 고통의 원인을 알아낼 수도, 그래서 해결한다고 약속할 수도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더욱 우리의 삶과 분리되지 않은 채 꽉 껴안은 모습 그대로의 고통 말이다”라면서 “문득 낯설어지는 우리의 삶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시인은 일상의 시간들에 가려진 죽음과 고통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령 시인은 전남 고흥 출생으로 2017년 계간 ‘시와 경계’로 등단, 시집 ‘어떤 돌은 밤에 웃는다’를 펴냈고, 토지 문학제 평사리 문학 대상을 수상했다.
고선주 기자 rainidea@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