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봄과 무비 저널리즘
김나영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입력 : 2024. 02. 13(화) 17:36
본문 음성 듣기
가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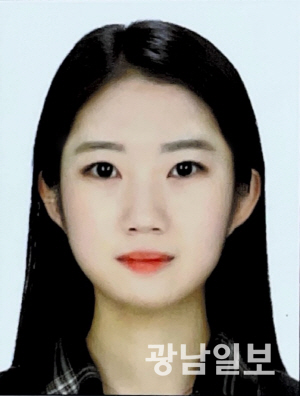
김나영 조선대학교 경영학부 4학년
[기고]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산 영화 ‘서울의 봄’을 관람했다. 많은 흥행을 탄 영화이기도 하고 종강 후 꼭 한번 보고 싶었던 영화이기에 친구와 영화관을 찾았다.
서울의 봄은 나에게 특별한 영화였다.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조선대학교에서 촬영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영화 속 실제 인물들이 조선대학교 동문인 사실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또 ‘서울의 봄’ 개봉 당시 수강 중이던 역사교양수업이 광주 역사인물을 공부하는 과목이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됐는데 역사 속 인물을 영화로 접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역사교양 공부를 하면서도 화가 나고 슬퍼했던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미 영화를 본 많은 친구들은 분노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시작한 후에 영화관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같은 장면에서 분노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서 서울의 봄 영화가 무비 저널리즘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무비 저널리즘’이란 영화가 오락적 쾌감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에 비춰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당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현 세대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영화를 본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12·12 쿠데타로 반란군의 총에 사망한 고 정선엽 병장이 47년 만에 졸업장을 받는다는 소식이었다.
신기하게도 역사교양 수업을 들을 당시, 만학도 어르신이 계셨다. 교수님은 어르신에게 수업 도중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는지’라는 질문을 건냈다. 어르신은 ‘당시 모든 대학생과 많은 사람들이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 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화운동 역사 속의 산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의 상황이 조금은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이처럼 아직 광주에 살아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배우 ‘안내상’이 실제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영화를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배우지만, 안내상은 실제로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나 역시도 역사교양수업 중 ‘이한열 열사‘에 대해 배우던 중 알게 됐다.
배우 안내상은 1987년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던 Top3에 들어가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당시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절친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자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줬다.
‘이한열 열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인물로, 무장군의 최루탄에 머리를 직탄으로 맞아 피습당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사망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6월 항쟁 이후 6·29 선언이 이뤄지며 결국 그가 간절히 원했던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이를 보지 못한 채 20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당시 젊은 나이의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웠고 희생당했다. 이들은 오직 민주화만을 원했고 희망했다. 그들의 바람은 결국 이뤄졌지만 이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당시의 어린 나이로써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무장군인들을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소수의 욕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가뜨렸고 민주화를 망쳤다. 이것을 보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 아픈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현재 민주화가 정착돼 지금 우리들에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많은 인물들께 감사함을 표하며 마치는 바이다.
서울의 봄은 나에게 특별한 영화였다. 눈길을 끌었던 이유는 바로 조선대학교에서 촬영을 했다는 사실과 함께 영화 속 실제 인물들이 조선대학교 동문인 사실이 나에게 특별하게 다가왔다. 또 ‘서울의 봄’ 개봉 당시 수강 중이던 역사교양수업이 광주 역사인물을 공부하는 과목이었다. 특히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됐는데 역사 속 인물을 영화로 접하게 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당시 역사교양 공부를 하면서도 화가 나고 슬퍼했던 역사적 사건이었고, 이미 영화를 본 많은 친구들은 분노했다.
아니나 다를까, 영화를 시작한 후에 영화관에서는 탄식이 터져 나왔다. 모두가 같은 장면에서 분노를 하고 비슷한 생각을 했다. 이 부분에서 서울의 봄 영화가 무비 저널리즘의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고 생각한다. ‘무비 저널리즘’이란 영화가 오락적 쾌감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영화에 비춰 현실을 돌아보게 하는 기능을 말한다. 당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하지 못한 현 세대들에게도 역사적 사실을 환기시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적 사실들을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공부해야 한다는 분위기를 형성했다.
영화를 본 뒤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다. 12·12 쿠데타로 반란군의 총에 사망한 고 정선엽 병장이 47년 만에 졸업장을 받는다는 소식이었다.
신기하게도 역사교양 수업을 들을 당시, 만학도 어르신이 계셨다. 교수님은 어르신에게 수업 도중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로 5·18민주화운동에 참여하셨는지’라는 질문을 건냈다. 어르신은 ‘당시 모든 대학생과 많은 사람들이 무기가 될 만한 모든 것들을 들고 나가 싸웠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민주화운동 역사 속의 산증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당시의 상황이 조금은 머릿속으로 그려졌다. 이처럼 아직 광주에 살아계신 많은 어르신들이 민주화운동을 경험했다는 사실은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해줬다.
많은 사람들이 영화에서 배우 ‘안내상’이 실제 사건과 관련 있는 인물이라는 사실은 모른 채 영화를 봤을 것이다. 우리에게 친근한 배우지만, 안내상은 실제로 민주화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나 역시도 역사교양수업 중 ‘이한열 열사‘에 대해 배우던 중 알게 됐다.
배우 안내상은 1987년 군사정권시절, 민주화를 위해 앞장서던 Top3에 들어가던 학생이었다. 그리고 당시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사망한 이한열 열사의 절친한 친구로도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가 사망하자 그의 곁을 끝까지 지켜줬다.
‘이한열 열사’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인물로, 무장군의 최루탄에 머리를 직탄으로 맞아 피습당해 병원으로 바로 이송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사망했다. 그리고 이한열 열사의 사망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됐다.
6월 항쟁 이후 6·29 선언이 이뤄지며 결국 그가 간절히 원했던 민주화는 이뤄졌지만 이를 보지 못한 채 20세의 이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이렇게 당시 젊은 나이의 많은 대학생들이 민주화를 위해 맞서 싸웠고 희생당했다. 이들은 오직 민주화만을 원했고 희망했다. 그들의 바람은 결국 이뤄졌지만 이 이면에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었다. 당시의 어린 나이로써 나서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황에, 무장군인들을 상대로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정말 대단하고 존경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영화를 보고 기억에 남는 장면들이 몇 개 있다. 그 중 하나를 꼽자면 ‘넌 대한민국 군인으로도 인간으로도 자격이 없어’라고 말하는 장면이다. 소수의 욕심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역사를 망가뜨렸고 민주화를 망쳤다. 이것을 보며 자격이 없는 사람이 권력을 가지게 되면 안된다는 것을 절실히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 아픈 우리의 역사를 바탕으로 더 나은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역사를 잊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잘못된 역사는 바로 잡아야 하고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 많은 분들의 희생으로 현재 민주화가 정착돼 지금 우리들에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역사 속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셨던 많은 인물들께 감사함을 표하며 마치는 바이다.
광남일보@gwangnam.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