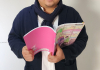지휘는 마음 통해야…사회와 연결되는 무대 꾸밀 터
[남도예술인]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
성악 전공자 출신…전국 최초 시립단원 출신 첫 지휘자
2003년 아마추어 광주남성합창단 전신 파파합창단 결성
"음악 해석하기 전 단원과 소통돼야 음악 자연스러워져"
성악 전공자 출신…전국 최초 시립단원 출신 첫 지휘자
2003년 아마추어 광주남성합창단 전신 파파합창단 결성
"음악 해석하기 전 단원과 소통돼야 음악 자연스러워져"
입력 : 2022. 12. 22(목) 18:28

이준 광주시립합창단 부지휘자는 “음악을 해석하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이 돼야 한다. 소통이 돼야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밝혔다.
전국 최초 시립합창단 단원 출신 첫 지휘자. 광주시립합창단 이준 부지휘자를 떠올리면 따라붙는 수식어다. 성악을 전공한 성악가로 시립합창단 출신 지휘자이기 때문이다.
이 부지휘자는 중학생 때 기타를 곧잘 쳤다고 한다. 기타 쇠줄을 이리저리 튕겨보면서 거기에 맞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어깨너머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짚어가며 코드를 쳐가면서 그렇게. 그러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열살 차이 나는 형의 권유로 노래를 불러보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성악을 배우게 되면서 교회 성가대 활동도 시작했다. 성악에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학, 동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다.
“스스로 제가 노래를 잘 하는지 몰랐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성악가가 내 길인가보다’ 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인정해주니 그게 성취감으로, 나아가 보람으로 바뀌었죠.”
대학생이 되자마자 성가대에서 활동하면서 지휘에 도전했다. 그는 졸업해서도 지휘를 계속했다. 동네 아저씨들을 한 데 모아 합창단을 조직했다. 딸아이 친구 아버지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시자 노래를 가르쳐주기로 한 게 이같은 합창단이 생기게 된 계기다. 친목으로 형성된 모임이 광주파파남성합창단으로 발전했다. 2003년 12월, 7명으로 첫 발을 뗀 남성파파남성합창단은 2012년 광주남성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40여 명의 구성원들과 크고 작은 무대를 꾸리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한목소리를 내오면서 제2회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제 대상과 제13회 대전 대통령상 전국합창페스티벌 대상을 따내기도 했다.
 그는 지휘를 할 때 성악을 전공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프로들의 경우 목을 풀고 악보가 나오면 부르기만 하면 되게끔 무대를 위한 준비를 마쳐놓는 반면, 아마추어 합창단은 발성하는 시간을 갖고 목소리를 맞추는 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 알려줄 수 있어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성악을 먼저 전공하기를 잘했다고 여긴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휘를 할 때 성악을 전공한 경험이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했다. 프로들의 경우 목을 풀고 악보가 나오면 부르기만 하면 되게끔 무대를 위한 준비를 마쳐놓는 반면, 아마추어 합창단은 발성하는 시간을 갖고 목소리를 맞추는 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어떤 목소리를 내야 하는 지 알려줄 수 있어 지휘자로 활동하고 있지만 성악을 먼저 전공하기를 잘했다고 여긴다는 설명이다.
“지휘자로 활동하면서부터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 않고 있죠. 성악은 컨디션 조절이 중요했는데, 지휘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제 지휘가 중심이돼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하모니를 이루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의 기량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지역에서 아마추어합창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 그는 당시 광주시립합창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마침 부지휘자 자리가 공석이어서다. 대학교 1학년이던 1988년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에 이어 2009년 베이스 수석으로 활동, 같은 해 부지휘자로 위촉받았다.
 “단원에서 부지휘자로는 제가 전국 첫 사례였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셈이죠. 부지휘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쭉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계획했다기 보다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눈 떠보니 부지휘자가 된 겁니다. 부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고 무대에 선지는 13년째네요.”
“단원에서 부지휘자로는 제가 전국 첫 사례였어요. 새로운 길을 개척한 셈이죠. 부지휘자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몰랐어요. 쭉 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할 거라 예상했거든요. 계획했다기 보다 하루 아침에 일어난 일이죠. 눈 떠보니 부지휘자가 된 겁니다. 부지휘자로 합창단을 이끌고 무대에 선지는 13년째네요.”
부지휘자가 되고 나서는 광주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 지휘 역량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단원으로 여러 객원지휘자들을 두루 만나 함께 합을 맞춰본 게 도움이 됐다.
그는 단원 출신으로 시립합창단과 오래 함께 했다 보니 단원들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게 됐다고 한다. 외부 인사인 상임지휘자와 단원들의 중간 다리역할도 맡는다.
“지휘는 마음이 통해야 해요. 노래를 하기 전에 그 공기를 먼저 맞춰야 하죠. 내가 생각하는 공기의 느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마음으로는 노래가 안되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노래에 들어가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해석하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이 돼야 해요. 소통이 돼야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지역 5개 자치구 공연장을 도는 시립합창단 순회 무대를 선보여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휘를 통해 매 무대마다 시민들과 함께한 것이다. 독일 작곡가 헤르만 네케의 경쾌한 춤곡을 무반주 합창곡으로 편곡한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를 비롯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클래식은 물론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수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와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인 ‘안녕’,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등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곡이나 가요 등도 선사했다. 실력파 뮤지션과 협업, 라이브 연주를 선보여 많은 이들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그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지역 5개 자치구 공연장을 도는 시립합창단 순회 무대를 선보여 바쁜 나날을 보냈다. 지휘를 통해 매 무대마다 시민들과 함께한 것이다. 독일 작곡가 헤르만 네케의 경쾌한 춤곡을 무반주 합창곡으로 편곡한 ‘크시코스의 우편마차’를 비롯해 브람스의 ‘헝가리 무곡’과 로시니의 ‘윌리엄텔 서곡’, 오페라 ‘라크메’ 중 ‘꽃의 이중창’,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축배의 노래’ 등 클래식은 물론이다. 시민들로 하여금 충분한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가수 하림의 ‘사랑이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와 드라마 ‘호텔 델루나’ OST인 ‘안녕’, 이적의 ‘당연한 것들’ 등 계절감을 살릴 수 있는 곡이나 가요 등도 선사했다. 실력파 뮤지션과 협업, 라이브 연주를 선보여 많은 이들에 위로의 메시지를 전달해 큰 호응을 얻었다.
한 목소리로 딱 맞는 화음을 선보이기 위해 요즘 고민이 늘었다는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간 지휘를 하면서 자신있게 무대에 올랐는데, 몇 년 사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네요. 젊었을 때는 밀어 부쳤다면,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단원-지휘자, 단원-단원, 단원-소리 등을 내는 환경, 가장 완벽한 음악을 해낼 수 있는 공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니 책임감도 큽니다.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에, 서로 양보하고 맞춰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무대를 보이기 힘들죠. 앞으로도 조화를 이뤄 사회와 연결되는 무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지휘자는 중학생 때 기타를 곧잘 쳤다고 한다. 기타 쇠줄을 이리저리 튕겨보면서 거기에 맞춰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다. 어깨너머 손가락으로 기타 줄을 짚어가며 코드를 쳐가면서 그렇게. 그러다 음악을 하고 싶어 했던 열살 차이 나는 형의 권유로 노래를 불러보기로 했다. 고등학생 때 성악을 배우게 되면서 교회 성가대 활동도 시작했다. 성악에 두각을 나타낸 그는 전남대 예술대학 음악학과에 입학, 동 대학원에서 공부를 마쳤다.
“스스로 제가 노래를 잘 하는지 몰랐어요. 대학교에 입학한 뒤 첫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것을 보고 깨달았죠. 그러면서 ‘나는 진짜 성악가가 내 길인가보다’ 했어요. 주변에서 잘한다고 인정해주니 그게 성취감으로, 나아가 보람으로 바뀌었죠.”
대학생이 되자마자 성가대에서 활동하면서 지휘에 도전했다. 그는 졸업해서도 지휘를 계속했다. 동네 아저씨들을 한 데 모아 합창단을 조직했다. 딸아이 친구 아버지들이 날이면 날마다 모이기만 하면 술을 마시자 노래를 가르쳐주기로 한 게 이같은 합창단이 생기게 된 계기다. 친목으로 형성된 모임이 광주파파남성합창단으로 발전했다. 2003년 12월, 7명으로 첫 발을 뗀 남성파파남성합창단은 2012년 광주남성합창단으로 이름을 바꾸고 현재 40여 명의 구성원들과 크고 작은 무대를 꾸리고 있다. 삼삼오오 모여 한목소리를 내오면서 제2회 창원 전국그랑프리 합창제 대상과 제13회 대전 대통령상 전국합창페스티벌 대상을 따내기도 했다.

광주남성합창단의 무대 모습
“지휘자로 활동하면서부터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지 않고 있죠. 성악은 컨디션 조절이 중요했는데, 지휘를 하면서 거기에서 조금 자유로워질 수 있었어요. 제 지휘가 중심이돼 사람들의 목소리를 한데 모아 하모니를 이루니 제가 하고 싶었던 음악을 찾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사람들의 기량이 발전해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보람도 느낍니다.”
지역에서 아마추어합창단을 꾸려 활발한 활동을 펼치던 중 그는 당시 광주시립합창단으로부터 제안을 받았다. 마침 부지휘자 자리가 공석이어서다. 대학교 1학년이던 1988년 시립합창단 비상임 단원에 이어 2009년 베이스 수석으로 활동, 같은 해 부지휘자로 위촉받았다.

합창 무대에서 지휘를 하는 이 부지휘자
부지휘자가 되고 나서는 광주대 대학원에서 합창지휘를 공부, 지휘 역량을 넓히기 위해 노력했다. 단원으로 여러 객원지휘자들을 두루 만나 함께 합을 맞춰본 게 도움이 됐다.
그는 단원 출신으로 시립합창단과 오래 함께 했다 보니 단원들의 마음을 잘 살필 줄 알게 됐다고 한다. 외부 인사인 상임지휘자와 단원들의 중간 다리역할도 맡는다.
“지휘는 마음이 통해야 해요. 노래를 하기 전에 그 공기를 먼저 맞춰야 하죠. 내가 생각하는 공기의 느낌. 환경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불편한 마음으로는 노래가 안되죠. 환경을 조성한 다음에 노래에 들어가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악을 해석하기 전에 단원들과 소통이 돼야 해요. 소통이 돼야 음악의 흐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광주시립합창단 기획연주회 모습
한 목소리로 딱 맞는 화음을 선보이기 위해 요즘 고민이 늘었다는 그는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다.
“그간 지휘를 하면서 자신있게 무대에 올랐는데, 몇 년 사이 하면 할수록 어렵게 느껴지네요. 젊었을 때는 밀어 부쳤다면, 요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단원-지휘자, 단원-단원, 단원-소리 등을 내는 환경, 가장 완벽한 음악을 해낼 수 있는 공기를 유도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음악이 만들어지는 거니 책임감도 큽니다. 성향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기에, 서로 양보하고 맞춰나갈 수 있도록 조율하지 않으면 좋은 무대를 보이기 힘들죠. 앞으로도 조화를 이뤄 사회와 연결되는 무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