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어는 전라도 사람들과 생태적으로 닮았죠"
[포커스 이사람] ‘홍어에 진심’ 소설가 문순태
3년 간 쓴 전라도 정체성 깃든 홍어 시편들 시집 엮어
삭힘과정에 거듭남 투영…음식 매개 다양한 삶 통찰
줄곧 남도 형상화 지속…사인회 5일 나주 홍어축제서
3년 간 쓴 전라도 정체성 깃든 홍어 시편들 시집 엮어
삭힘과정에 거듭남 투영…음식 매개 다양한 삶 통찰
줄곧 남도 형상화 지속…사인회 5일 나주 홍어축제서
입력 : 2023. 04. 30(일) 18:38
본문 음성 듣기
가가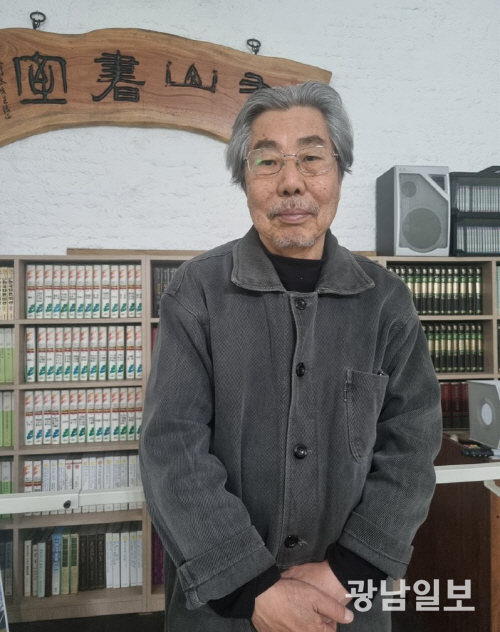
문순태 작가는 “한 골짜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 본다. 그렇기에 저는 전라도를 사랑하는 작가, 고향을 사랑하는 작가로 남고 싶다”고 밝혔다.
그의 집 냉장고에는 항상 홍어가 있다. 문득 홍어가 떠올라 입에 침이 고이는 날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기침을 많이 하는 날에는 어김없이 홍어요리를 상에 올렸다. 텁텁한 목에 도움이 됐기 때문이다. 날씨가 궂으면 단짝인 막걸리도 함께. 그는 홍어요리 중에서도 먹기 어렵다는 코를 제일 좋아한다. 씹으면 씹을수록 톡 쏘는 강한 맛이 입맛에 맞아서다. 이처럼 그는 홍어에 진심이다. 그가 열렬히도 좋아하는 홍어, 그에게 홍어는 소울푸드나 다름없다.
소설가이자 시인. 전라도의 한(恨)을 미학으로 승화시켜 문단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긴 문순태 작가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여러 문학작품을 내놓아온 그가 이번에는 홍어를 시편으로 승화한 시집 ‘홍어’(문학들 刊)를 들고 왔다. 아무래도 홍어를 단순히 즐겨 먹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찼던 모양이다.
이런 그를 최근 담양 가사면 생오지 문학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먼저 ‘홍어’는 2013년 펴낸 첫 시집 ‘생오지에 누워’(책만드는집 刊), 2018년 ‘생오지 생각’ 이후 나온 세 번째 시집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그가 3년여 간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쓴 시 125편 중 고른 100편을 엮은 것이다. 시집에는 삼합은 물론이고, 무침, 탕, 전, 튀김, 찜 등 홍어를 식재료 삼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코와 애, 날개 등 홍어의 부위별 맛 등까지 우리네 삶과 역사를 홍어와 연결지은 시들이다. 또 홍어 집산지이자 홍어거리가 조성돼 있는 영산포와 영산포 축제 등도 형상화했다. 1801년 홍어장수 문순득이 풍랑을 만나 필리핀 등 동남아를 떠돌다가 3년 2개월 만에 우이도에 돌아와 정약전과 만나 표류기 ‘표해시말’(漂海始末)을 쓰게 된 이야기도 담겼다.
이처럼 그가 홍어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홍어를 유별나게 좋아한 데서 시작한다. 담양이 고향인 그는 어려서부터 홍어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담양에는 바다가 없어 홍어요리는 동네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이후 홍어가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는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였다고 한다. 홍어가 풍기는 냄새가 고약하고 보기 흉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극우세력 사이에서 혹은 정치판에서 편 가르기를 할 때 어김없이 홍어가 등장하는 게 불편했다. 이는 그가 홍어를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 삼아 글을 쓰게 된 계기나 다름없다.
그는 홍어를 남도의 대표적 전통 음식의 하나이자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본다. 그에게 홍어가 단순한 물고기 이상의 의미인 이유다.

 ‘홍어, 전라도의 힘이여’에서 ‘오래 삭힐수록 더 날카롭게/되살아나는 전라도 기질/ 아, 온몸 떨리게 하는/전라도의 힘이여’라거나 ‘썩는 것과 삭는 것1’에서 ‘홍어가 죽어서 향기 품으면/복사꽃 빛깔로 되살아난다/그러므로 발효는 부활…썩는 것과 삭는 것은, 숨을 멈춘 것과, 숨을 이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읊는 데서 엿볼 수 있듯, 전라도와 홍어가 닮았다고 여긴다.
‘홍어, 전라도의 힘이여’에서 ‘오래 삭힐수록 더 날카롭게/되살아나는 전라도 기질/ 아, 온몸 떨리게 하는/전라도의 힘이여’라거나 ‘썩는 것과 삭는 것1’에서 ‘홍어가 죽어서 향기 품으면/복사꽃 빛깔로 되살아난다/그러므로 발효는 부활…썩는 것과 삭는 것은, 숨을 멈춘 것과, 숨을 이어가는 것의 차이’라고 읊는 데서 엿볼 수 있듯, 전라도와 홍어가 닮았다고 여긴다.
“홍어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요. 부레가 없어서 떠있지 못하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삽니다. 그 모습이 한을 품고 엎드려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과 닮았죠. 홍어와 생태적으로 비슷하달까요.”
홍어가 죽은 다음 어두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인고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맛과 향기로 거듭나는 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한다.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듯 발효돼 곰삭는 과정을 ‘한의 미학’으로 승화시킨다. 홍어가 삭힌 다음 더 나은 존재가 되듯 삭힘의 관점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인생을 살아내며 접하는 사회 속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가 바뀌는 삶, 이를 자기 자신에 투영시킨다. 홍어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셈이다.
이런 그는 유난히 남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발표한 단편소설 ‘징소리’의 문학적 공간은 방울재로 장성 북상면 덕재마을이 실제 배경이다.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과정을 통해 산업화가 지닌 강제성·폭력성, 이들이 겪는 상실감 등을 다뤘다. 1987년 장편소설로 나온 ‘타오르는 강’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실화인 나주 관삼면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1886년 노비 세습제의 폐지로부터 동학농민전쟁, 구한말의 의병활동 등 역사 속에서 잊힌 민중들의 저항을 다룬다. 이외에 지리산 피아골이 배경인 장편소설 ‘피아골’ 등도 지역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가 생오지로 들어온 뒤부터는 소설집 ‘생오지 눈사람’(2016)과 ‘생오지 뜸부기’(2021) 등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기도 했다.
“6·25전쟁과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굴곡진 세월을 겪으면서 전라도는 유독 핍박과 소외로 인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사묻힌 곳이죠. 이 지역에서 태어난 문인으로 이같은 배경을 외면할 수 없어 지역 이야기부터 쓰자 생각한 게 남도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을 내놓게 됐네요.”

 오랜 세월 글을 쓰다 보니 작품세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해나갔다는 그는 세상을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게 문학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늘 가슴 속에 새긴 채 작품에 임하고 있다.
오랜 세월 글을 쓰다 보니 작품세계가 자연스럽게 변화해나갔다는 그는 세상을 살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시각을 기르는 게 문학이라는 본래의 가치를 늘 가슴 속에 새긴 채 작품에 임하고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 작품세계도 변화했죠. 민중 지향에서 한의 미학과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총체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도와주는 게 문학입니다. 정말 좋은 문학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길 안내자죠.”
그는 최근 사단법인 나주학회, 영산포발전협의회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을 강독하고 연구하는 등 지역 문학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지역 작가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동네 무당은 안 알아주듯 지역 문인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작가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대 교수로 정년퇴임한 뒤 50여 년 만에 고향인 담양에 터를 잡고 문예창작촌을 열어 이끌고 있는 만큼 문학 작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끝으로 문 작가는 자신의 두 다리를 디디고 서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문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을 쓸 때 작품의 무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공간이어야 해요. 한 골짜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 보죠. 그렇기에 저는 전라도를 사랑하는 작가, 고향을 사랑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시집 ‘홍어’ 출판기념회는 지난 4월 나주시 영강동 어울림 센터에서 성황리 열린 가운데 이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열릴 ‘제19회 영산초 홍어축제’ 행사 첫 날 오후 2시에는 홍어 전시관에서 작가 사인회와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문순태 작가는 조선대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58년 광주고 3학년 때 가명으로 낸 시가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1959년 ‘농촌중보’ 신춘문예에 소설 ‘소나기’로 각각 당선됐다. 1965년 고 김현승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이 실렸고,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가 당선됐다. 순천대(1994~1997), 광주대(1997~2006) 교수를 역임, 한국소설문학작품상 및 문학세계작가상, 이상문학상 특별상, 채만식문학상, 요산문학상, 송순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고향으로 가는 바람’, ‘철쭉제’, ‘징소리’, ‘생오지 뜸부기’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걸어서 하늘까지’, ‘대하소설로 ‘타오르는 강’ 시리즈 등이 있다.
소설가이자 시인. 전라도의 한(恨)을 미학으로 승화시켜 문단에 적지 않은 족적을 남긴 문순태 작가의 이야기다. 지금까지 여러 문학작품을 내놓아온 그가 이번에는 홍어를 시편으로 승화한 시집 ‘홍어’(문학들 刊)를 들고 왔다. 아무래도 홍어를 단순히 즐겨 먹는 것만으로는 성에 안찼던 모양이다.
이런 그를 최근 담양 가사면 생오지 문학의 집에서 만났다. 그는 먼저 ‘홍어’는 2013년 펴낸 첫 시집 ‘생오지에 누워’(책만드는집 刊), 2018년 ‘생오지 생각’ 이후 나온 세 번째 시집이라고 소개했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그가 3년여 간 바깥 출입을 자제하며 쓴 시 125편 중 고른 100편을 엮은 것이다. 시집에는 삼합은 물론이고, 무침, 탕, 전, 튀김, 찜 등 홍어를 식재료 삼아 해볼 수 있는 다양한 요리가 등장한다. 뿐만 아니라 코와 애, 날개 등 홍어의 부위별 맛 등까지 우리네 삶과 역사를 홍어와 연결지은 시들이다. 또 홍어 집산지이자 홍어거리가 조성돼 있는 영산포와 영산포 축제 등도 형상화했다. 1801년 홍어장수 문순득이 풍랑을 만나 필리핀 등 동남아를 떠돌다가 3년 2개월 만에 우이도에 돌아와 정약전과 만나 표류기 ‘표해시말’(漂海始末)을 쓰게 된 이야기도 담겼다.
이처럼 그가 홍어에 대한 시를 쓸 수 있었던 것은 홍어를 유별나게 좋아한 데서 시작한다. 담양이 고향인 그는 어려서부터 홍어를 즐겨 먹었다고 한다. 담양에는 바다가 없어 홍어요리는 동네 잔칫날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다. 그러나 5·18민주화운동 이후 홍어가 전라도 사람을 비하하는 의미로 쓰이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는 뭔지 모를 감정에 휩싸였다고 한다. 홍어가 풍기는 냄새가 고약하고 보기 흉하다는 이유를 들어 일부 극우세력 사이에서 혹은 정치판에서 편 가르기를 할 때 어김없이 홍어가 등장하는 게 불편했다. 이는 그가 홍어를 좋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주제 삼아 글을 쓰게 된 계기나 다름없다.
그는 홍어를 남도의 대표적 전통 음식의 하나이자 민초들의 고통과 눈물이 오롯이 배어 있는 정신적 가치라고 본다. 그에게 홍어가 단순한 물고기 이상의 의미인 이유다.

시집 ‘홍어’ 출판간담회 모습

소설 ‘타오르는 강’의 배경인 나주의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생들과 함께한 문 작가
“홍어는 날개가 있는데 날지 못해요. 부레가 없어서 떠있지 못하고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아 삽니다. 그 모습이 한을 품고 엎드려 살아온 전라도 사람들과 닮았죠. 홍어와 생태적으로 비슷하달까요.”
홍어가 죽은 다음 어두운 항아리 속으로 들어가 인고의 시간을 지나 새로운 맛과 향기로 거듭나는 것을 인간의 삶에 비유한다. 고통의 과정을 겪으면서 새로운 나로 거듭나듯 발효돼 곰삭는 과정을 ‘한의 미학’으로 승화시킨다. 홍어가 삭힌 다음 더 나은 존재가 되듯 삭힘의 관점이야말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인생을 살아내며 접하는 사회 속 사람들을 통해 끊임없이 자아가 바뀌는 삶, 이를 자기 자신에 투영시킨다. 홍어와 자신을 동일시 하는 셈이다.
이런 그는 유난히 남도를 배경으로 한 작품을 많이 남긴 작가로 알려져 있다. 1970년대 발표한 단편소설 ‘징소리’의 문학적 공간은 방울재로 장성 북상면 덕재마을이 실제 배경이다. 댐 건설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이 도시빈민으로 전락한 과정을 통해 산업화가 지닌 강제성·폭력성, 이들이 겪는 상실감 등을 다뤘다. 1987년 장편소설로 나온 ‘타오르는 강’은 영산강을 배경으로 실화인 나주 관삼면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으로 1886년 노비 세습제의 폐지로부터 동학농민전쟁, 구한말의 의병활동 등 역사 속에서 잊힌 민중들의 저항을 다룬다. 이외에 지리산 피아골이 배경인 장편소설 ‘피아골’ 등도 지역을 작품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가 생오지로 들어온 뒤부터는 소설집 ‘생오지 눈사람’(2016)과 ‘생오지 뜸부기’(2021) 등 이 공간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쓰기도 했다.
“6·25전쟁과 동학농민운동, 광주학생독립운동, 5·18민주화운동 등 굴곡진 세월을 겪으면서 전라도는 유독 핍박과 소외로 인한 상처가 많아요. 그래서 슬픔과 안타까움이 사묻힌 곳이죠. 이 지역에서 태어난 문인으로 이같은 배경을 외면할 수 없어 지역 이야기부터 쓰자 생각한 게 남도를 배경으로 여러 작품을 내놓게 됐네요.”

담양 가사문학면 생오지길 작업실에서 함께 한 문 작가와 고 이성부 시인

생오지 문학의 집 전경
“세월이 지나면서 제 작품세계도 변화했죠. 민중 지향에서 한의 미학과 주제의식을 강화하는 것으로, 최근 몇 년 사이에는 총체적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방식으로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을 찾게 도와주는 게 문학입니다. 정말 좋은 문학은 올바른 삶을 살게 하는 길 안내자죠.”
그는 최근 사단법인 나주학회, 영산포발전협의회가 대하소설 ‘타오르는 강’을 강독하고 연구하는 등 지역 문학작품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지역 작가들을 향한 애정 어린 시선을 당부하기도 했다. 한동네 무당은 안 알아주듯 지역 문인들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 지역이 그 작가를 키우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대 교수로 정년퇴임한 뒤 50여 년 만에 고향인 담양에 터를 잡고 문예창작촌을 열어 이끌고 있는 만큼 문학 작품에 관심있는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날 예정이다.
끝으로 문 작가는 자신의 두 다리를 디디고 서 있는 지역을 사랑하는 문인으로 기억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글을 쓸 때 작품의 무대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공간이어야 해요. 한 골짜기가 엄청난 이야기를 품고 있고 그 이야기를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풀어내는 게 작가의 역할이라 보죠. 그렇기에 저는 전라도를 사랑하는 작가, 고향을 사랑하는 작가로 남고 싶습니다.”
시집 ‘홍어’ 출판기념회는 지난 4월 나주시 영강동 어울림 센터에서 성황리 열린 가운데 이어 이달 5일부터 7일까지 열릴 ‘제19회 영산초 홍어축제’ 행사 첫 날 오후 2시에는 홍어 전시관에서 작가 사인회와 토크콘서트가 예정돼 있다.
문순태 작가는 조선대와 숭실대 대학원을 졸업했다. 1958년 광주고 3학년 때 가명으로 낸 시가 전남일보 신춘문예에, 1959년 ‘농촌중보’ 신춘문예에 소설 ‘소나기’로 각각 당선됐다. 1965년 고 김현승 선생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에 시 ‘천재들’이 실렸고, 1974년 ‘한국문학’ 신인상에 소설 ‘백제의 미소’가 당선됐다. 순천대(1994~1997), 광주대(1997~2006) 교수를 역임, 한국소설문학작품상 및 문학세계작가상, 이상문학상 특별상, 채만식문학상, 요산문학상, 송순문학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주요 작품으로는 ‘고향으로 가는 바람’, ‘철쭉제’, ‘징소리’, ‘생오지 뜸부기’ 등이 있고, 장편소설로는 ‘걸어서 하늘까지’, ‘대하소설로 ‘타오르는 강’ 시리즈 등이 있다.
정채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